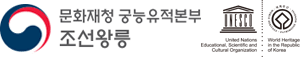조선왕릉
동구릉 학술이야기
동구릉과 사람들
왕실의 장례를 치르고 왕릉을 조영, 관리하는 일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예법을 충실히 따르며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능의 입지 선정, 조영된 능의 관리감독, 천장 등 왕릉과 관련된 사항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같이 했다.
휘릉의 수리 종료를 보고하지 않은 승지 홍인호를 파직하다 - 『정조실록』 1793년(정조 17) 5월15일

이때에 휘릉(徽陵)의 정자각을 수리해 고치는 역사가 있었다.
역사를 끝냈다는 서계가 승정원에 이르렀는데도 승지가 상이 재계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두고 아뢰지 않았는데, 상이 경연의 신하들을 통해 듣고서는, 일의 관계됨이 막중하므로 재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어 승지 홍인호(洪仁浩)를 파직하고 급히 그 계본을 찾아오게 하여 호조 판서와 능관(陵官) 등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정자각의 수리 공사 완료가 늦춰졌다는 이유로 승지가 파직을 당하였다. 이는 당시 왕릉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조선 왕릉은 유교를 국교로 천명했던 조선시대에 있어 왕조의 근간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였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인 만큼 조선 왕실은 별도의 국가 관리기관을 마련하여 능역 별로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이러한 덕분에 조선 왕릉은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홍인호(洪仁浩)
1753년∼1799년.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원서(元瑞)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다산 정약용의 6촌 처남이다. 1774년(영조 50)진사가 되었고, 1777년(정조1) 병과에 급제하였다. 교리, 부교리, 중화부사, 승지 등을 거쳐 1791년(정조 15)에 대사간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번 대사간을 역임하였다.1798년(정조 22)에는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고,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왕명으로 각 도의 『형옥결안(刑獄決案)』을 편교하였으며, 그의 동생 홍의호(洪義浩)가 이를 『심리록(審理錄)』으로 증수, 간행하였다. 1798년(정조 22)에는 강원도 관찰사로서 관내 부세 징수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논의하고 지방 수령들의 가렴주구의 실상을 자세히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