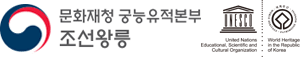학술마당
조선왕릉의 문화
조선왕릉의 제례문화
조선시대는 유교국가로 제사 문화는 국가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물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성시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제례는 역대 제왕과 왕후에 대한 제사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례의(五禮儀) 가운데 길례(吉禮)에 해당한다. 제례는 속절제(俗節祭)와 기신제(忌辰祭)로 나눌 수 있다. 속절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대표 하는 날(정월초,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섣달 그믐)과 청명(淸明)날에 각 능에서 모시는 제례를 의미하며, 기신제는 왕이나 왕비가 세상을 떠난 날인 기일에 제를 봉행하는 예이다.
조선 초에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 불교식으로 기신제를 모셨지만 세종 15년(1433)부터 유교의식의 예를 정립하고 이를 모든 제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제례의식은 법식에 따라 경건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제례를 모시기 하루 이틀 전 봉심(奉審)이라 하여 반드시 능이 무고한지 살피는 의식을 먼저 행하고, 제례 시 제관들은 검은 뿔모자에 옅푸른 제복을 입고 검은 대와 끈으로 여미며 예화(禮靴)를 착용하고 의식을 행하였다. 그 의식의 내용(친향례 親享禮)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준비의식 - 궁궐 |
|
|---|---|
| 준비의식 - 왕릉 |
|
| 제례의식 |
|
제례를 위한 상차림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왕릉제례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진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음식을 담는 제기는 제기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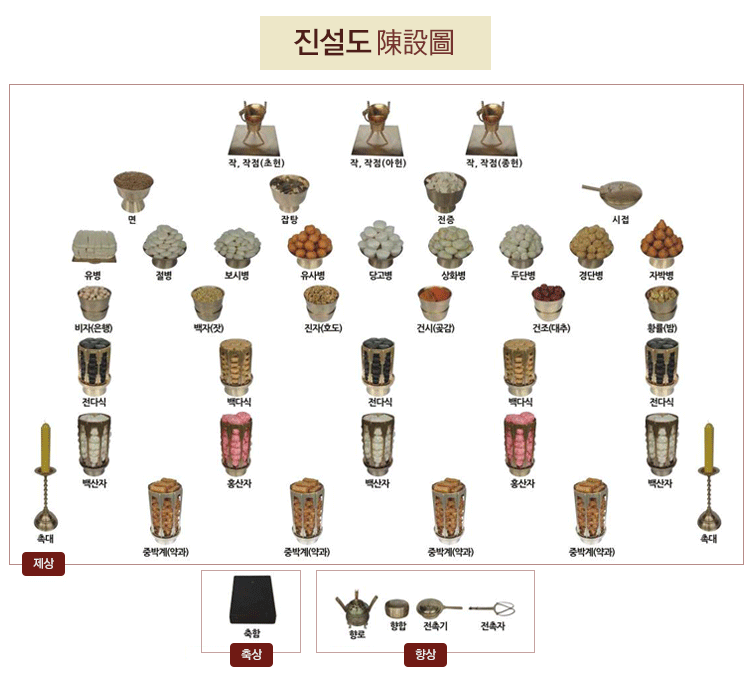
이러한 왕릉제례는 종묘제례와 사직대제와 같은 국가차원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조선후기까지 잘 보존되어 왔고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국조오례의』를 보완한 『대한예전』에 따라 천자국(황제)의 제례로 실행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이 되기까지 제례는 지속되어 왔고, 광복 후 혼란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1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 이후 1956년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조직된 후 제례를 복원하고, 1957년 음력 5월 24일에 태조의 건원릉에서 해방 후 첫 제례를 봉행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조선왕릉의 기록문화
조선은 국가의례로 설정된 흉례(凶禮)에 왕과 왕비의 승하한 순간으로부터 성복과 발인, 견전, 안릉,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담제에 이르기까지 총 27개월에 걸쳐 그 의례가 행해지며, 이후 길례(吉禮)로서 정기적인 제향이 뒤따른다. 왕릉의 조성 과정은 흉례 속에서 규정된다. 조선의 국가의례인 오례(五禮)는 고려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기초로 하고 중국의 『정관례(貞觀禮)』, 『개원례(開元禮)』, 송(宋)과 명(明)의 의례서(儀禮書)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와 성종의 『국조오례의』에서 자세하게 갖추어졌다. 후왕은 위와 같은 의례를 갖추어 선왕의 국장을 치루고 그 능을 조성하여 왕조의 성역이자 역사의 유산으로 남기려는 의지 속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실록(實錄)』과 『의궤(儀軌)』, 그리고 『능지(陵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문헌들은 오늘날까지 현존하여 조선왕실의 역사는 물론 제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가 된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역사서로 왕릉에 관련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의궤』는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으로, 장례에 관련한 『국장도감의궤』, 『빈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가 있다. 이 중 『산릉도감의궤』는 왕릉을 조성할 당시의 공사 준공보고서 성격을 갖는 책으로, 왕릉 조성을 전후로 논의된 내용, 각종 공문, 건축하는데 소용된 물품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능지』는 능역을 지키는 절목과 제례를 행할 때의 절차를 그때그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능관(陵官)이 소임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 역할을 한 책이다. 대부분 제례와 수호에 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능역의 위치 및 건물의 규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요소 등도 기록되어 있다.